이달의 이슈
요약정보
5·18 38주년 기념식에서 행방불명된 당시 8살의 이창현군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귀복씨의 이야기가 소개됐고, 하루가 지난 5월 19일에는 38년 전 역사의 현장이었던 ACC 극장 1에서 행방불명자들의 이야기를 녹여낸 [언젠가 봄날에]가 올려졌다. 마치 알고 준비한 것처럼. 이제는 행방불명자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처럼.
- 아티클
- 공연
공감
링크복사
- #5.18
- #마당극
- #행방불명자
- #언젠가봄날에
- #박강의
ⓒ사진 최명진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전날까지 오락가락하던 비가 그치고 하늘은 점점 맑아졌다. ACC 앞 도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갓길에는 부산, 서울 등의 다양한 행선지를 부친 대형버스들이 일렬로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풍물패의 풍물 가락과 민중가요, 다양한 사투리 억양이 섞인 구호,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5·18 기념티를 입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 곳을 넘어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 시도민 대책위원회 농성장안의 어르신들까지.. 5월 19일 오후 3시 ACC 극장1에서 있을 공연 [언젠가 봄날에]를 보러 가는 길은 참으로 많은 풍경들이 엉켜 있었다. 다행스럽다가도 착잡하기도 하고, 억울했다가도 맥이 빠지는, 무언가 찝찝하고 미해결된 것만 같은 그런 정체모를 감정.....
ⓒ사진 최명진
“이제 저승 가자. 우리 찾았으면 벌써 찾았제”
“38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f15”
“망각의 강을 건넌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뼛다구를 찾아 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언젠가 봄날에] 中 저승사자와 불법체류 귀신들의 대화
“38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f15”
“망각의 강을 건넌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뼛다구를 찾아 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언젠가 봄날에] 中 저승사자와 불법체류 귀신들의 대화
ⓒ사진 최명진
극은 무당 박조금의 굿판으로 시작된다. 연이어 등장하는 5·18 행방불명자 귀신들과 저승사자의 소동.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귀천을 떠도는 일명 ‘불법체류귀신’들의 사연은 2017년의 촛불집회, 세월호 등 현재의 이야기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극 안에서는 ‘찾다’, ‘날 보러 와요’, ‘당신을 보러 내가 왔다’, '잊다/ 잊지 않겠다’ 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우리가 진도 팽목항에서, 목포 신항에서, 촛불을 든 거리에서, 혹은 TV 앞에서 참으로 많이 외치고 중얼거렸던 그 말들이......
ⓒ사진 최명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한 단락 한 단락 쌓아올리는 마당극 한 판
그리하여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어떤 울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한 단락 한 단락 쌓아올리는 마당극 한 판
그리하여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어떤 울림
연출가 박강의씨의 마당극에 대한 지론은 다음과 같다. “결국 ‘마당극’은 사회적 현실의 한복판 즉 ‘삶의 마당’에서 대다수 일반 대중의 구체적 삶의 모습과 그 염원을 규격화된 무대에서가 아니라 옥 내외를 가림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설정된 공간을 통하여 공연되는 연극인 셈이다”. 2010년에 첫 무대를 가진 [언젠가 봄날에]의 파릇파릇하고 풋풋했던 무대에 비한다면 8년이 지난 이번 무대는 농익을 대로 농익은 배우들의 호연 속에 러닝 타임 70분이 물 흐르듯 흘러간다. 같은 대본, 같은 배우, 같은 음악과 효과.... 그런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극에 끌려들어가고 만다.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마당극의 특성상 [언젠가 봄날에]도 세상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변용을 거듭했고 그리하여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광주는 물론 서울, 경상도, 제주, 해외까지 수많은 장소에서 올려진 [언젠가 봄날에]의 ACC 극장1의 공연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곳이야말로 38년 전 [언젠가 봄날에]의 이야기가 시작된 전남도청이기 때문. 이 특별한 공연을 만들어 내기 위해 김종원 피디는 [언젠가 봄날에]를 ACC 극장에 초청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공을 들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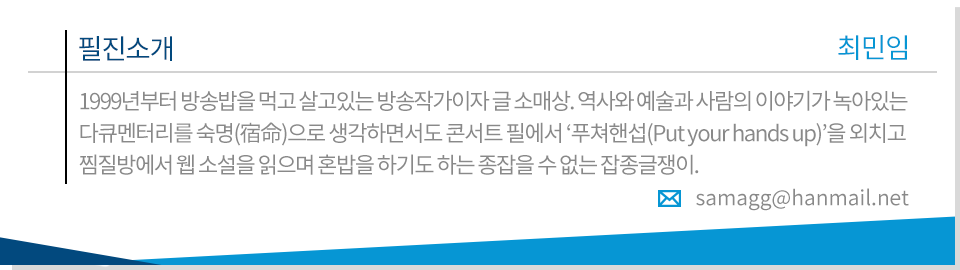
ⓒ사진 최명진
“대한민국에서 당신 같은 부모가 어디 한 둘이야”
-[언젠가 봄날에] 中 저승사자
-[언젠가 봄날에] 中 저승사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대이자 이 극의 연출을 맡은 박강의 연출가는 한 인터뷰에서 그녀의 장구한 광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언젠가 봄날에]를 꼽았다. 2010년 5·18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작품이 관객을 만난 것은 벌써 8년째. 그 8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 캐릭터도 감동의 포인트도 그리고 이 극을 마주한 배우와 관객의 마음마저도... 그 한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박강의 연출가의 인터뷰가 있다.
“행방불명자들에 대해서 작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엄군들에게서 죽은 여학생,
시민군, 백구두라는 날라리 아저씨. 이 귀신들이 날마다 만나서 노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러 가요. 엄마가 ‘아가 니 어딨냐?’
나 여기 있는디’. ‘나 니 암만 찾아도 없드란 말이다’.
‘엄마 나 쩌그 있는디’. ‘아가 걱정하지 말어. 내가 니 꼭 찾아줄 거인 게’.”
“여고생 때 찍은 사진을 들고 아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우리 극중에서는 딸이 서있는
거지. 엄마 무릎을 베고 딸이 그래요. ‘엄마. 고맙네.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팽목항에서 공연을 했는데 내가 음향을 보고 있는데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아픈 거예요. 5·18 때 죽은 딸을 못 찾고 있는 엄마와
바다 앞에 죽은 딸을 두고 못 찾고 있는 엄마들이 40년이 세월을 두고 역사와 비극이
랑데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던....”
시민군, 백구두라는 날라리 아저씨. 이 귀신들이 날마다 만나서 노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러 가요. 엄마가 ‘아가 니 어딨냐?’
나 여기 있는디’. ‘나 니 암만 찾아도 없드란 말이다’.
‘엄마 나 쩌그 있는디’. ‘아가 걱정하지 말어. 내가 니 꼭 찾아줄 거인 게’.”
“여고생 때 찍은 사진을 들고 아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우리 극중에서는 딸이 서있는
거지. 엄마 무릎을 베고 딸이 그래요. ‘엄마. 고맙네.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팽목항에서 공연을 했는데 내가 음향을 보고 있는데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아픈 거예요. 5·18 때 죽은 딸을 못 찾고 있는 엄마와
바다 앞에 죽은 딸을 두고 못 찾고 있는 엄마들이 40년이 세월을 두고 역사와 비극이
랑데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가슴이 무너졌던 사람은 박강의 연출가뿐만 아니었다. 이번 공연에서도 저승사자가 “대한민국에서 당신 같은 부모가 어디 한 둘이야”라고 내뱉자마자 마음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계엄군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정옥이가 엄마와 남동생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기 시작했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 최명진
그 언젠가 만나고 싶은 눈이 부신 봄날에....
이것은 5·18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의 이야기다.
아니 아니
이것은 저마다의 ‘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것은 5·18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의 이야기다.
아니 아니
이것은 저마다의 ‘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사진 최명진
울지 말자. 울지 말자. 더 이상 5·18 마당극을 보면서 울지 말자. 하지만 그것은 헛된 다짐일 뿐이었다. 혼을 쏙 빼놓을 듯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전라도 사투리와 해학 넘치는 걸쭉한 입담과는 대조되는 무겁디 무거운 탈춤 판. 시민군들의 항쟁을 형상화한 군무의 역동적인 춤사위가 동작 하나 하나가 슬로우 모션처럼 온다. 탈춤의 저 익살스러운 표정은 울지 못해 웃는 것 같은 우리들 같다. 더 이상 울지 말자. 아니 울음을 어찌할 수 없다면 울더라도 이것만은 꼭 다짐하자. 4·3, 5·18, 4·16... 풀지 못한 이 땅의 그 모든 아픔들을, 당신의 서글픈 기억들을 잊지 말 것! 기억할 것! 우리가 말하는 그 언젠가 그 ‘봄날’은 잊지 않음으로써 온다. 기억이야말로 역사를 미래로 이어줄 ‘동아줄’임으로- 눈물을 닦아줄 봄날은 ‘기억하는 자’가 만드는 것임으로-
- by
공감
링크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