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황(敦煌)과 경주
불교문화로 이어진 두 도시
요약정보
'둔황과 경주' 고대 중국 대륙의 서부 끝에 위치한 소도시 둔황. 여기를 거쳐야만 고대 중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이역인 '서역(西域)'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둔황은 고대 중국의 서부 관문이었다. 반면 경주는 한반도에서도 남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지도를 펼쳐놓으면 그 머나먼 거리 때문에 전혀 무관한, 완전히 별개의 두 도시로 보인다. 그런데 둔황과 경주라는 두 점을 선으로 연결시켜 준 것이 있었으니, 불교문화이다.
- 아카이브
- 칼럼
공감
링크복사
- #불교
- #경주
- #둔황
- #감산사
- #보살상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다. 프랑스의 젊은 동양학자 펠리오(Pélliot)는 1908년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3m도 안 되는 둔황 모까오쿠(莫高窟) '장경동(藏經洞)'에서 혜초(약 704-780)라는 승려가 쓴 이 책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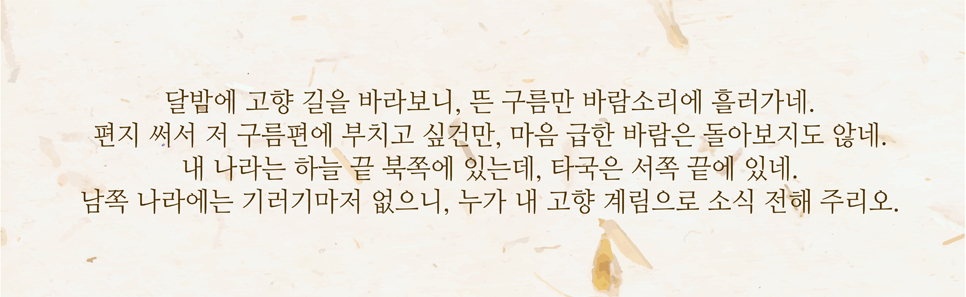
혜초는 이 책에서 고향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본학자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郞)는 이 시구를 토대로 혜초가 신라 승려임을 밝혀냈다. 왕오천축국전은 723년부터 4년 동안 인도를 돌아본 혜초의 인도 여행기다. 혜초는 광주(廣州)를 출발해 바닷길로 인도에 갔다가, 실크로드의 중요 지점인 쿠차(龜玆)를 거쳐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 길에서 혜초는 '천불동(千佛洞)'라 불리는 둔황석굴을 들렀을 것이다. 일본의 한 학자는 '현존하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혜초가 귀로에서 둔황에 체재하면서 쓴 초고본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까지 펼쳤는데, 두 도시 둔황과 경주를 이어준 것은 승려와 문학이었다.


<감산사 미륵보살입상>
통일신라(7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통일신라(7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82호 감산사 미륵보살입상은 둔황과 경주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문물이다. 719년 신라 육두품 귀족 김지성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아미타불상과 함께 이 보살상을 제작했다. 등신대 크기의 두 석상은 원래 김지성이 건립한 경주의 감산사에 안치되었는데, 현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웅건하게 서있다.
정면을 바라보며 몸을 꼿꼿하게 세운 아미타불이 부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면, 아미타불보다 약간 작게 만든 미륵보살상은 온몸에 장신구들을 걸치고 몸을 살짝 비틀고 선 수줍은 여성처럼 만들어졌다.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이 보살상에 경주와 둔황을 이어주는 '코드'가 숨어 있다.
미륵보살상은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모습이었다. 기존의 보살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이다. 보살상의 옷차림이나 몸에 걸친 장신구는 한국의 다른 보살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감산사 미륵보살상은 세계 어느 불교 '조각'에서도 볼 수 없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그리하여 이 보살상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에서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다. 흥미롭게도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이역만리 둔황에 있었다.


정면을 바라보며 몸을 꼿꼿하게 세운 아미타불이 부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면, 아미타불보다 약간 작게 만든 미륵보살상은 온몸에 장신구들을 걸치고 몸을 살짝 비틀고 선 수줍은 여성처럼 만들어졌다.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이 보살상에 경주와 둔황을 이어주는 '코드'가 숨어 있다.
미륵보살상은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모습이었다. 기존의 보살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이다. 보살상의 옷차림이나 몸에 걸친 장신구는 한국의 다른 보살상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감산사 미륵보살상은 세계 어느 불교 '조각'에서도 볼 수 없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그리하여 이 보살상은 동아시아 불교조각에서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다. 흥미롭게도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이역만리 둔황에 있었다.
<감산사 미륵보살입상> 부분
감산사 미륵보살상이 미술사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양 어깨에 과장되게 표현된 나비매듭과 그 매듭에서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넓은 천 자락이었다. 어떤 불교조각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719년에 제작된 이 상에서 출현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왜 안 보이는지 도통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둔황의 화려한 '벽화'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달라진다. 벽화 속 보살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天人)들의 어깨 위에 동일한 모양의 차림새를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장경동에서 나온 비단에 그려진 번(幡) 그림에도 이런 차림새의 보살상이 많다.
발견의 기쁨도 잠시, 다시 곤혹스러움이 밀려온다. 둔황 벽화들의 제작연대가 감산사 미륵보살상보다 늦은 8세기 중반 이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런 차림새는 둔황보다 경주에서 더 빨리 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주에서 둔황으로 전래된 게 아닐까'란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다. 그러나 8세기 동아시아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추론이 무리하다는 것을 쉽사리 알아챌 수 있다. 이 차림새에 얽힌 많은 문제들을 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문화 전파에서 '화본(畵本)'이라는 그림의 역할을 떠올린다면 얽힌 난마들이 질서정연하게 풀리기 시작한다.


<허공장보살도>, 둔황 모까오쿠 제237굴 서벽,
9세기(『敦煌石窟全集12-佛敎東傳故事畵卷』, 도99)
9세기(『敦煌石窟全集12-佛敎東傳故事畵卷』, 도99)
감산사 보살상의 어깨 위에 표현된 차림새는 긴 줄 형태의 목걸이를 등 뒤에서 묶었을 때 표현되는 매듭과 거기서 내려오는 두 줄을 나타낸 것이다. 나비매듭은 신체 뒷면에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를 볼 수 없는 정면향의 인물상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측면상의 경우에는 매듭과 등을 따라 내려오는 천 조각을 일 부 볼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데 예술가들은 굳이 정면상에도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술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깨 위의 매듭장식과 거리서 아래로 내려오는 끈은 원래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유행하던 리본 장식의 영향 아래 출현한 것으로, 지금은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석굴과 서역남로에 위치한 호탄(Khotan 和田, 于闐)을 거쳐 중국에 전래되었다. 그리하여 '위지을승(尉遲乙僧)'을 중심으로 하는 서역출신 화가들이 당나라 중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7세기 후반에는 이런 차림새의 보살상이 장안 등지에서 유행했을 것이다. 장안의 유행은 이웃나라인 신라로 그리고 중국의 변방인 돈황 등으로 전파되어 나갔다.
감산사 미륵보살상을 제작한 김지성은 705년 신라의 사신으로 당나라에 다녀왔다. 고대의 외교사절은 문화사절이기도 했다. 당나라에서 번역된 최신 불교경전을 비롯해 많은 문화와 문물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다. 이 가운데는 휴대가 용이한 불상과 보살상의 그림들이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당에 다녀온 적이 있는 김지성이 불상과 보살상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신이 당에서 가져온 서역화풍의 그림들이었으며, 그는 석공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동일한 상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림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 둔황 모까오쿠 제156굴 남벽
9세기(『中國石窟-敦煌莫高窟4』, 北京: 文物出版社, 1987, 도140)
9세기(『中國石窟-敦煌莫高窟4』, 北京: 文物出版社, 1987, 도140)
710년 현종 집권 후 오도자(吳道子)라는 최고의 화가가 등장하면서 당나라 중앙화단의 양상이 완전히 변화한다. 오도자가 구사하는 화풍은 서역화풍과는 이질적인 중국의 전통적인 화풍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역화풍의 퇴조로 감산사 미륵보살상과 같은 옷차림새의 상들은 더 이상 유행하지 않았고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둔황의 상황은 달랐다. 8세기 중엽 토번(吐藩, 지금의 티베트)이 둔황을 점령하고, 호탄 출신 화가들을 중용하자 서역적 전통을 가진 옷차림새가 지속적으로 유행했다. 그리하여 둔황과 경주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다.
둔황과 경주. 비록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고대의 두 도시는 불교문학과 예술을 통해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둔황과 경주. 비록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고대의 두 도시는 불교문학과 예술을 통해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소현숙(원광대 역사교육과 초빙교수)
- by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웹진 - Asia
공감
링크복사






